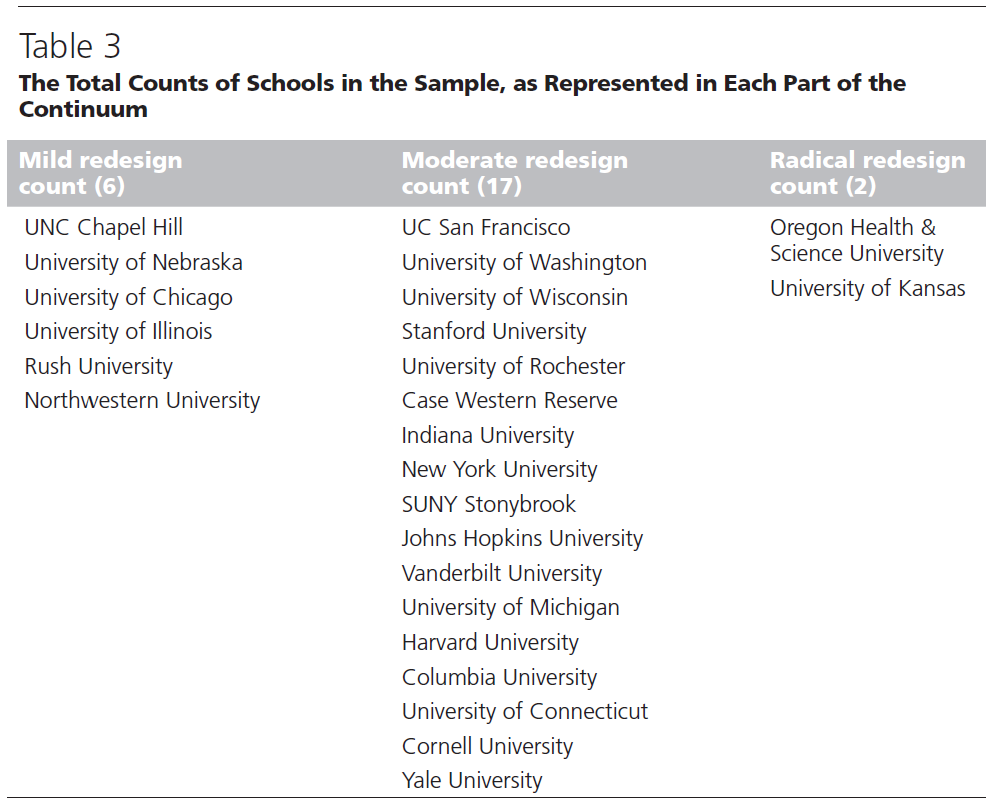1. 한 2년 전부터 의학교육을 하는 것은 마치 초기 스타트업과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2. 명합앱 리멤버가 초기에 명함을 직접 수기로 입력했다는 이야기나, 배민 초기에 전단지를 모으로 다녔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의학교육에서 "명함입력"이나 "전단지 줍기"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3. 요즘에도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는 eo 이고, 스타트업 오디션 프로인 유니콘 하우스도 재밌게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아시아 박지웅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 - 결정할 사람, 만들 사람, 팔 사람 - 만 있으면 된다고 한 이야기가 인상깊었다.
4. 의학교육이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결정할 사람, 만들 사람, 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 나는 그 중에 뭘 해야하나? 다 해야하나? 누구랑 해야하나?
5. 종종 의학교육 논문을 보다보면 이 분야를 enterprise (예: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enterprise)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처음 접했을 때는 도대체 왜 'enterprise'라고 하는지 단순 영한번역만 가지고는 느낌이 잘 안 왔는데, 이제는 좀 어렴풋하게 알 것 같기도.
6. 유니콘 하우스에서 스타트업 대표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는 "문제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더 날카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7. 그러면 의학교육이라는 "enterprise"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고객은 누구이고, 그들의 pain point는 무엇인가?
8. 이해관계자는 많지만, 조금 단순화시켜서 학부(의과대학) 단위로만 보면, 교육의 일차 고객(?)은 학생이고, 교육의 최종 목표는 국시합ㄱ....이 아니라, 졸업성과 또는 "의사상"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그들의 pain point는 맞나?
9.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업은 매년 일정한 수의 고객(=학생)이 유입되고, 그들은 매년 일정한 금액(=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지불한다. 또한 고객의 특성은 상당히 예측가능하고, 또 상당히 균질하다.
10. 사업은 안 해봤지만, 이 정도로 목표치가 명확하고, 고객층은 예측가능+균질하며, 매출 측면에서 고객이 정기적/강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사업적으로 고객 파악도 꽤 손쉬운 편이고, 목표도 정하기 수월하고, 비지니스 모델도 있는건가?
11.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의학교육은 왜 혁신(당)하지 않을까?
12. 얼마 전 타과(의대 아님) 어떤 교수님과 의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플랙스너 보고서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알겠는데, 플랙스너 보고서 이후에 달라진게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뭐 통합교육과정도 생겼고, 시뮬레이션도 발달했고, 표준화환자도 도입되었고, 표준화된 대규모객관식시험, OSCE, MMI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딱히 답변하면서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더라.
13. 며칠 전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역량 프레임 구축 연구 공청회'가 있었다. 연구진 워크숍도 하고, 설문(시민 1,000명, 간호사 407명, 의대생 237명, 전공의 361명, 전문의 200명)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역량 프레임을 도출한 연구였다.
14. 엄청난 노고와 노력의 결과물에 감사하고,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과연 우리가 '역량 프레임워크가 부실해서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건가?'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면 욕하실거 같은데...) 약간 Reinventing the wheel이라는 느낌도 있었다.
15. 이미 뭐 이런저런 역량 프레임워크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역량 프레임워크의 부재라든가, 기존 프레임워크의 부실함이 아니라 역량이 제대로(일부 학교 일부 의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거 같은데..
16. 다시 고민에 빠진다. 의학교육은 왜 혁신(당)하지 않을까?
'이 밖에 아무거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2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한양의대 수상자(2022년 10월 17일의 기록) (0) | 2022.12.11 |
|---|---|
| 교육 1.0, 2.0, 3.0... (2018년 12월 5일의 기록) (0) | 2022.12.11 |
| "Every way of seeing is a way of not seeing."(2018년 11월 21일의 기록) (0) | 2022.12.11 |
| 형성평가에 대한 단상(2018년 11월 16일의 기록) (0) | 2022.12.11 |
| '아주 무거운 바퀴 굴리기' 대 '마차 몰기' (2021년 11월 16일의 기록)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