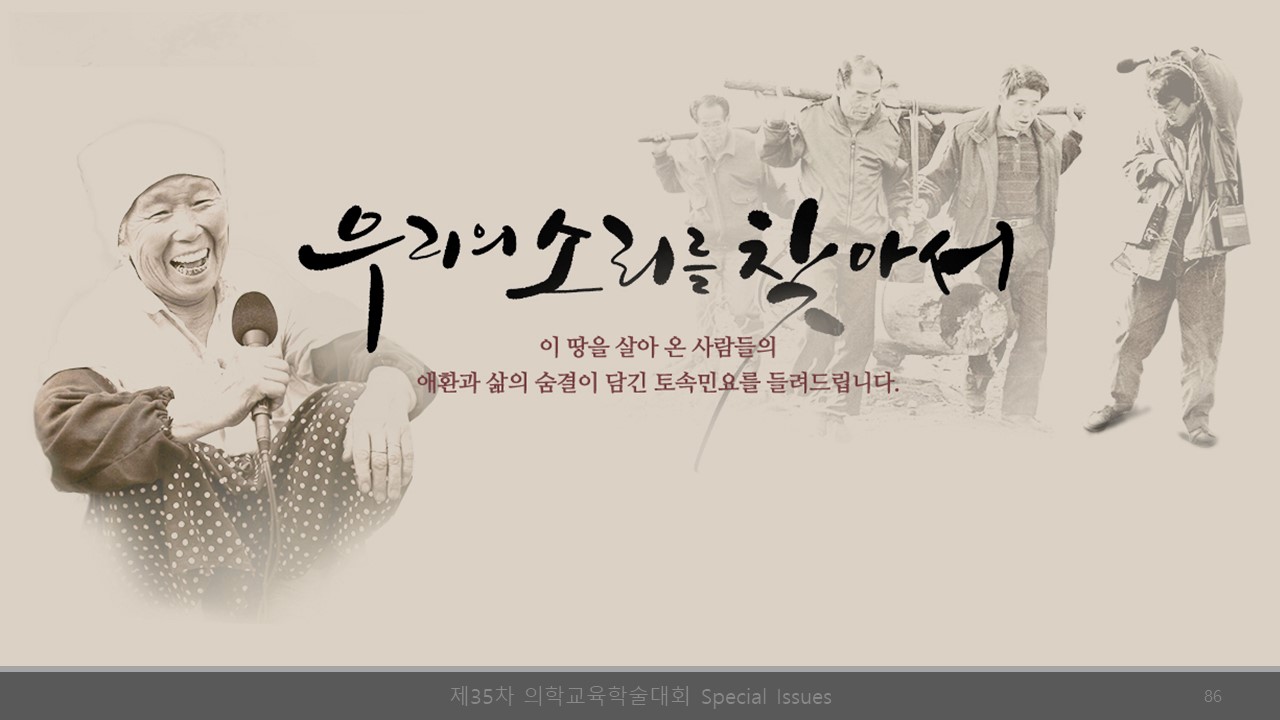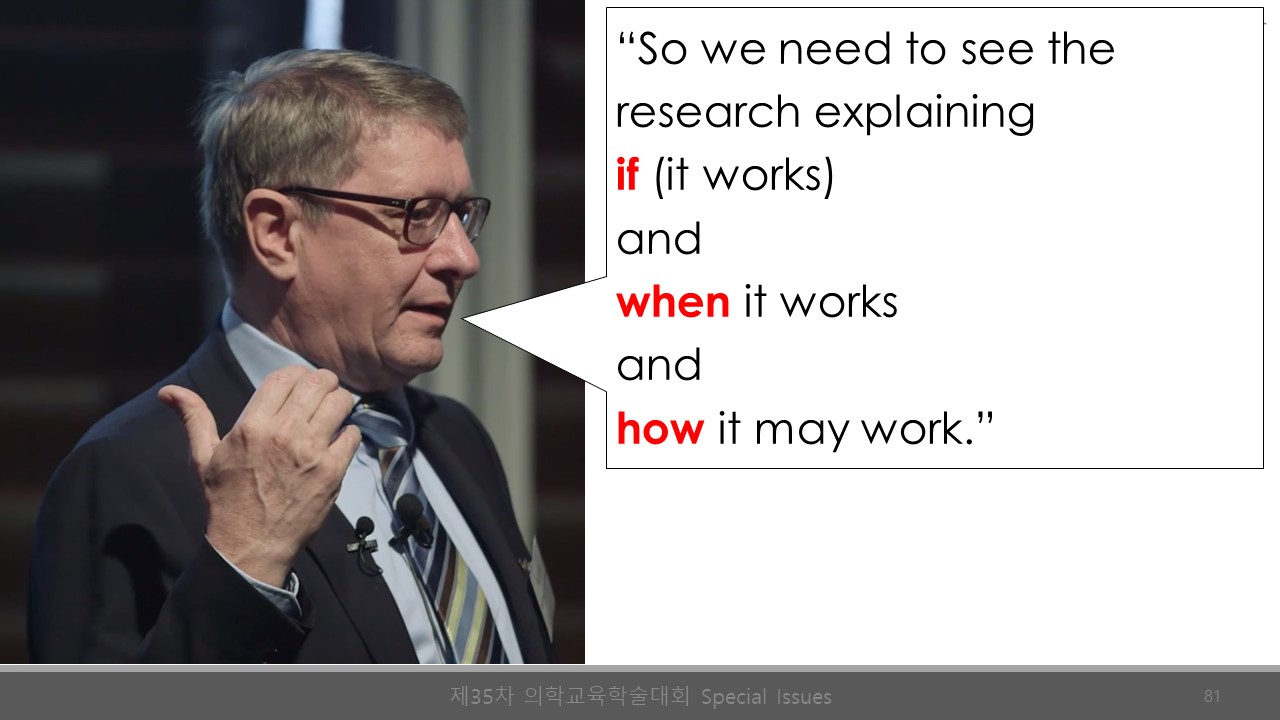1. 이번 제36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학교육의 최신 동향’ 세션에서 ‘COVID-19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맡게 되어, 이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정확히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저널(Academic Medicine, Medical Education, Medical Teacher)에 발표된 주요 article을 리뷰하고 정리할 기회가 생겼다.
2.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개선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결정할 때 ‘해야 하는 것(things that matter)’과 ‘할 수 있는 것(things you can control)’의 교집합에 초점을 두면 될 것이다. 그러나 COVID-19라는 불확실성의 시간은 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결국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what you should focus on)’도 불확실해졌다.
3. COVID-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의학교육의 변화와 발전에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보다 “수년,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가능했지만, 널리 도입되지 않던 혁신이 갑자기 일상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더 어울린다. 지금, 의학교육에서도 변화는 새로운 노멀이자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4. 이번에 article들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 질문에 따라 구분해보았다.
1)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2) 변화의 대상은 무엇인가?
3)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4) 학생은 무엇을 하였는가?
5. 고작 스무 개 남짓한 논문을 가지고 팬데믹 시대의 변화를 논하기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마지막 서너 개의 슬라이드에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면, 학기는 짧고, 교육은 길다. 불확실성의 시간 속에 교육의 기회 역시 순식간에 지나가고, 변화하는 순간순간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에 경험은 오류가 많으며, 교육적 의사결정과 판단은 어렵다. 팬데믹 이전, 일상적 상황에서 교육 개선을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고치는 것(Fixing the plane while flying it)”이라면,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에 밀리는 열기구의 방향을 잡아내는 것”과 같다. 삶의 바람 - 즉 COVID-19과 같은 불확실성의 힘 - 이 우리의 교육을 미지의 장소로 밀어낼 때엔, 열기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던져버려야 하듯, 여태껏 교육의 무게를 잡아준 신념과 확신을 버려야 한다. 그 신념과 확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이며,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말이기 때문이다.
6. 어차피 다 나와있는 논문 요약한 정도지만, 혹시나 싶어 마지막 발표한 자료를 슬라이드쉐어로 공유합니다.
https://www2.slideshare.net/ngene301/covid19-240160766
'학회에 참여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2022년 12월 9일의 기록) (0) | 2022.12.16 |
|---|---|
| 단 하나의 질문(2022년 12월 10일의 기록) (0) | 2022.12.11 |
| IAP YPL(Young Physician Leaders) 프로그램 참석후기(2022년 10월 19일의 기록) (0) | 2022.12.11 |
| 의학교육 데이터의 특성과 빅데이터 (2021년 12월 3일의 기록) (0) | 2022.12.11 |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idency Education 2021 요약 (2021년 10월 24일의 기록)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