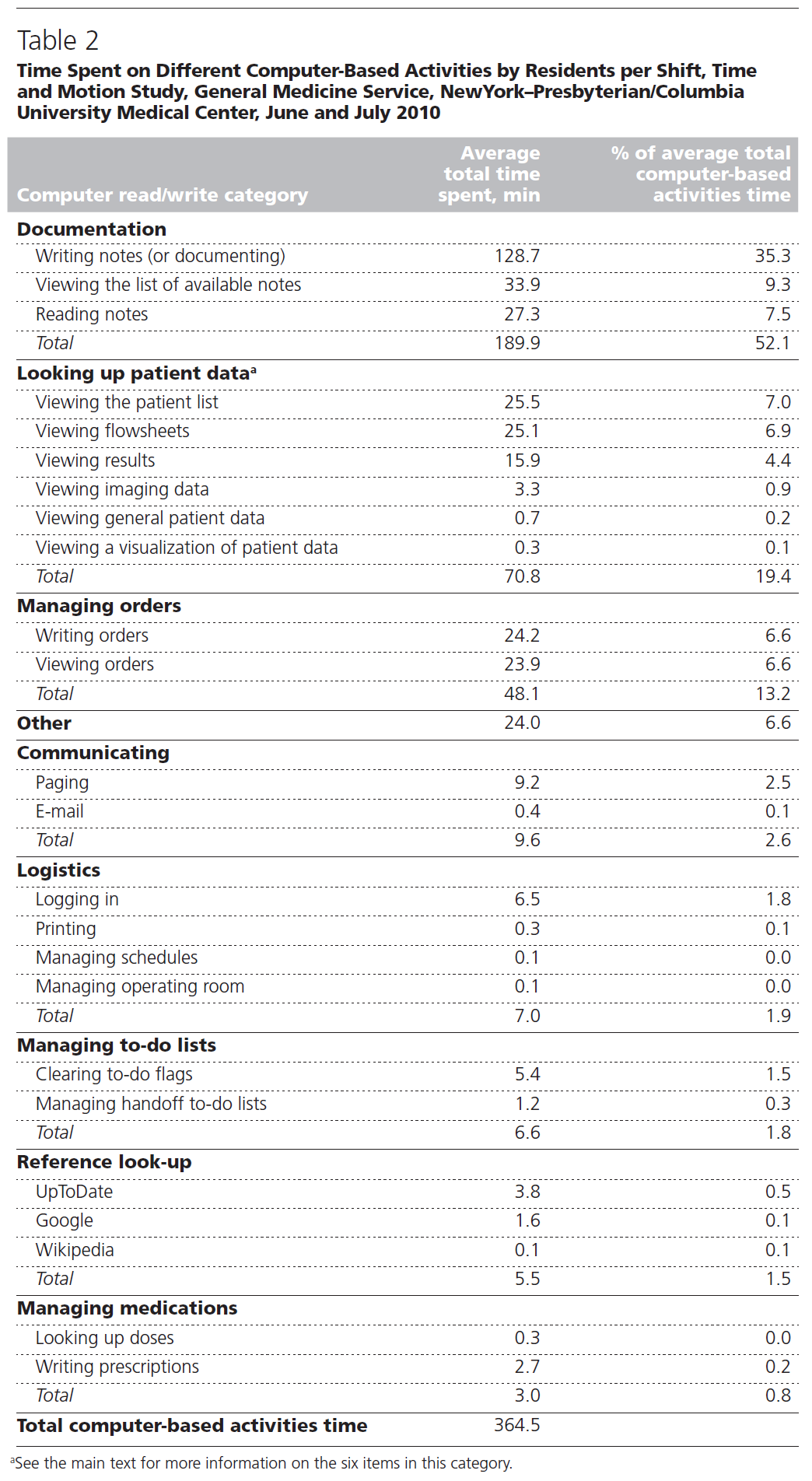1
학습의 과정process of learning을 복잡성 과학complexity science에 비유할 수 있다. 복잡하다는 것은 평형상태와는 한참 떨어진 ‘열린 시스템’을 뜻한다. 또한 ‘복잡하다’는 의미는 전체를 부분으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도 없으며, 단순 선형 방정식에 의해 설명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경계가 불분명하여 외부 세계에 개방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고,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다시 환경으로 되돌려준다.
2
복합complicated 시스템과 복잡complex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비교적 안정되어있는 측정 가능한 변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반면, 후자는 특정 요인의 영향은 그 요인이 어떤 시점에 다른 요인과 갖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 구성요소elements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 새로운 변수와 특징이 창발할 수도 있는데, 창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상호작용 프로세스 그 자체를 고려해야만 설명가능할 수도 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가설 검정 프레임워크’라는 의학교육 연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 지적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 할 때, 단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 한 변수의 효과는 단순히 다른 변수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비선형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언급하거나,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4
이러한 주장에는 공통적으로 ‘비선형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 이론 모두 비선형적 관계가 어떻게 예측불가능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학교육연구는 환원주의적 접근과 기존의 통계를 모두 버리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교육이란 너무 복잡하고 카오스적이어서 실증주의적 접근과 보편적인 것universals을 찾으려는 포기해야 하는가?
5
먼저 각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자.
•복합 시스템: 다수의 변후가 선형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변수들의 효과를 분리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스템에 미치는 전체적overall 영향을 알 수 있다. 선형 방정식 시그템으로 변수 사이의 관계를 포착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카오스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는, 시스템의 궁극적인 상태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비선형적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 하지만 변수 그 자체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변수의 수 자체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복잡 시스템: 비선형적 관계에 더하여, 다수의 불확정, 불안정, 불가지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불확정적 변수로 특징지어진다. 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조합해도 현실을 나타낼 수 없다. 복잡한 적응적 시스템 complex adaptive system은 다규모의 규칙성(자기-조직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개별 요소의 특성으로부터 추정할 수 없다.
6
이렇게 본다면 복잡 시스템과 카오스 시스템은 반대이다. 둘 모두 비선형성과 상호작용 관계로 인한 결과지만 복잡은 ‘여러 변수가 복잡하고 불확정한indefinable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만, 그 결과물outcome은 규칙적으로 예측가능 할 수’ 있고, 카오스는 ‘매우 작은 수의 변수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관계를 갖지만,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 시스템은 세계에 대한 고전적 결정론적 관점deterministic view과 일치한다.
7
양자물리학은 본질적으로 확률론적이지만, 그렇다고 정밀한 예측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c99의 경우, 특정한 원자가 붕괴하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모든 원자는 감마선을 140keV로 방출함으로써 붕괴할 것이고, 6.00 시간마다 절반이 붕괴할 것임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특정한 잎이 특정한 가을의 어느 날 나무에서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12월 31일까지 모든 잎이 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는 있다. 유방암 4기로 진단받은 여성이 언제 사망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1기로 진단받은 경우보다는 여생이 짧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많은 물리적 및 생물학적 현상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이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8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카오스’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사실 물리 이론에서 ‘카오스’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갖는다. 또한 어떤 시스템이 ‘chaotic’하려면, solution이 반드시 불확정indeterminate해야 한다. 그래서 카오스 시스템chaotic system은 역설적으로 매우 단순할 수 있다. 카오스는 수도꼭지의 물, 담배 연기, 교통 흐름 등 많은 현상에 적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자체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chaos와 disorder를 헷갈려한다. 카오스는 비선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며, 데이터세트가 절망적으로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매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9
역설적으로, 복잡성 이론은 카오스 이론과 정반대다. 이 두가지가 모두 비선형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복잡성 이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수의 상호작용적, 비선형적 요소들이 어떻게 규칙성(자기 조직화)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간단히 말하자면, “복잡성 이론은 어떻게 복잡한 시스템complex system이 단순한 결과를 생성하는지 보는 것”이다.
10.
따라서 복잡성 이론은 복잡하고, 다-요소 시스템에서 얼마나 쉽게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고전적, 결정론적 시스템의 결과로 관찰되는 규칙성]과의 중요한 차이는 복잡성 이론에서 규칙성은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복잡 시스템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관계/행동/양이 고정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소의 기능도 정의되지 않지만, ‘집합적 움직임collective motion’에는 규칙성이 관찰된다. 즉, 복잡 시스템의 초점은 ‘전체 시스템에 있으며, 개별 요소의 행동이나 개별 요소 사이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다.
11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학생이나, 아니면 개별 수업에서 얼마나 배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학습 조건이 다른 학습 조건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Norman, G. (2011). Chaos, complexity and complicatedness: lessons from rocket science. Medical education, 45(6), 549-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