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raging knowledge translation and implementation science in the pursuit of evidence informed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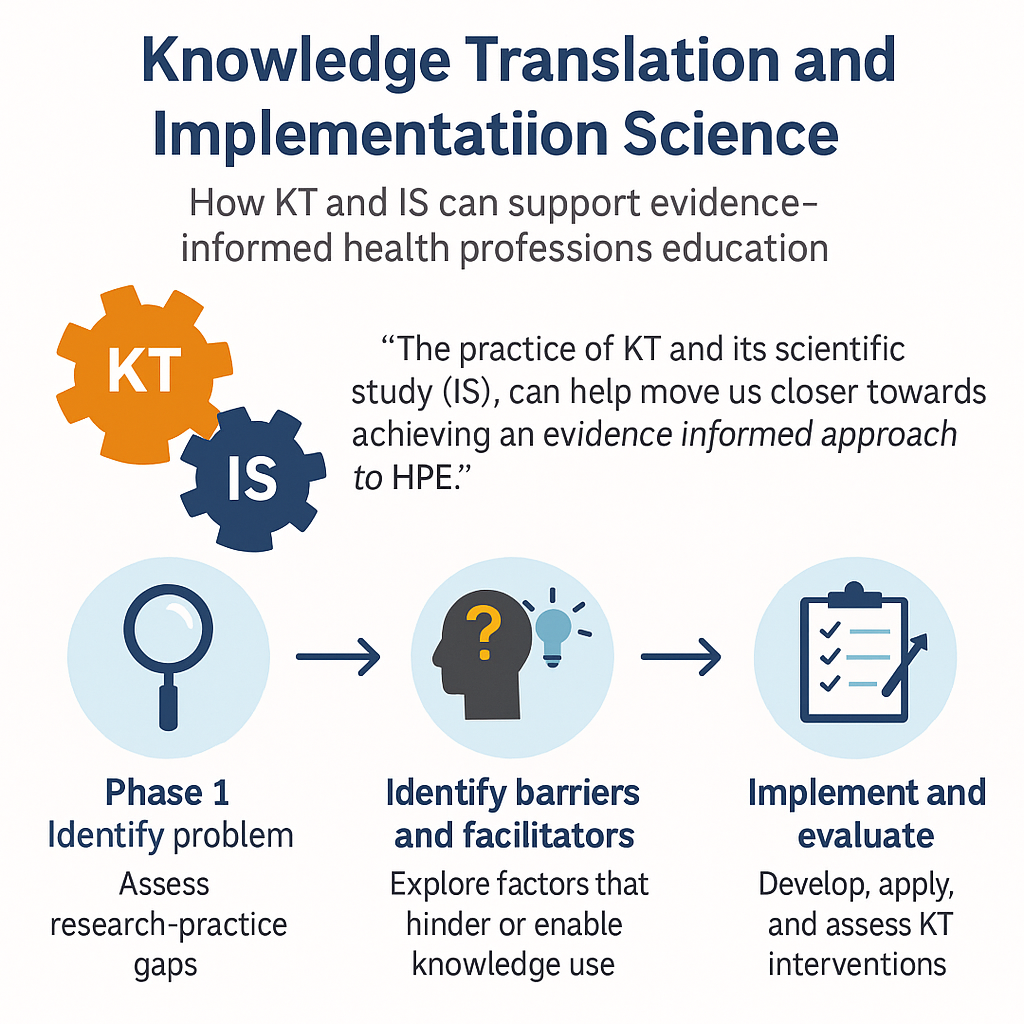
📘 지식전이(Knowledge Translation)와 실행과학(Implementation Science)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HPE)은 어떻게 '근거 중심(Evidence-Informed)'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보건의료전문직 교육(Health Professions Education, HPE)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보다,
👉 “이걸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해줄 수 있는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논문 제목: How knowledge translation and implementation science can support evidence-informed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저자: Onyura, Thomas, Steinert 외
저널: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2023)
🧭 배경: 왜 '연구'는 '교육 실천'으로 잘 안 옮겨질까?
보건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연구는 정말 많이 나오지만, 그게 실제 수업이나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연구진은 이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experiencing a phenomenon of inert knowledge.”
→ “우리는 ‘비활성 지식(inert knowledge)’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즉, 지식은 쌓이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간극은 단지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시스템 차원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답니다.
🧩 핵심 개념 두 가지!
Knowledge Translation (KT) 와 Implementation Science (IS)
이 논문은 KT와 IS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교육이 정말 ‘근거 중심(Evidence-Informed)’이 될 수 있을까?”를 파고들어요.
“The practice of KT and its scientific study (IS), can help move us closer towards achieving an evidence informed approach to HPE.”
→ “지식전이(KT)의 실천과 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실행과학(IS)은 HPE가 근거 중심 접근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AIMD 프레임워크로 살펴본 KT 실천 사례
논문에서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의 입학절차를 바꾸려는 실제 사례를 통해,
지식전이가 어떤 단계로 이뤄지는지를 AIM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 1단계: 문제 파악 – 지금 실천과 ‘최선의 실천(best practice)’ 사이의 간극 확인
- 기존 입학 방식(패널 면접) vs 문헌에서 제안하는 MMI 방식
- “Multiple short scenario-based interviews evaluating different attributes”
→ “복수의 짧은 시나리오 기반 면접이 각기 다른 속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2단계: 저해 요인과 촉진 요인 파악
- 촉진 요인: 교수의 동기, 시간 확보, 타 프로그램의 지원
- 저해 요인: 지식 부족, 자원 부족, 자신감 부족
- “Faculty’s lack of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successfully integrate MMI into their work schedule”
→ “교수진이 자신의 일정 안에 MMI를 통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
✅ 3단계: 개입 설계 및 평가
- AIMD 네 가지 질문:
- Aims: 목표는?
- Ingredients: 무엇이 개입의 구성요소인가?
- Mechanisms: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Deliver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예시 개입:
-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 타 프로그램 교수의 증언(testimonials)
- 웨비나/모의면접 체험
🤝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연구진은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We must ask who needs to be involved, when and why.”
→ “누가, 언제, 왜 참여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교육과정, 평가, 교수 개발, 학생 선발… 어느 것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 함께 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Faculty Development(교수 개발) 자체가 KT 개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 마무리하며
이 논문은 말합니다:
“Our hope is that this article has provided the reader with food for thought.”
→ “이 글이 독자에게 사유의 재료를 제공하길 바란다.”
📌 우리가 연구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선, 이론과 방법론, 조직과 사람, 시간과 맥락이 모두 고려되어야 해요.
지금 당장 정답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실천이 ‘근거 기반’에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
서론 (Introduction)
연구를 실천과 정책에 활용하자는 생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Caplan, 1975).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교육은 교육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교육자와 행정가는 학습자와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원이 제한된 체계에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evidence-based practices (근거 기반 실천)의 채택이 촉구되고 있다(Broekkamp & Van Hout-Wolters,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의 비체계적인 활용 또는 활용 부재는 여전히 교육 프로젝트의 진전과 성공을 저해하고 있다(Broekkamp & Van Hout-Wolters, 2007; Lysenko et al., 2014). 많은 교육 분야에서 근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inert knowledge(비활성 지식)’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Greenhalgh & Russell, 2006).
교육 연구와 실제 사이의 명백한 단절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 (a) 교육자는 과학적 문헌보다는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Lortie, 1975).
- (b) 통합되지 않은 비체계적인 증거에 접근하고 이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OECD, 2012).
- (c) 현실의 교육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근거가 부족하다(Hayward & Phillips, 2009).
- (d) 교육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연구로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다.
- (e) 전문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과 암묵지(tacit knowledge)가 ‘행동 가능한 지식(actionable knowledge)’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자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 소비자로 축소된다(Hammersley, 2004).
- (f)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들은 evidence-based medicine (EBM, 근거중심의학) 운동과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EBM이 주장하는 공식적인 근거의 개념과 실제 교육 실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식 및 근거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Levin, 2013).
보건의료전문직 교육(Health Professions Education, HPE)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근거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HPE 학문 공동체와 여러 이해관계자(예: 교사, 교육과정 책임자, 인증 기관 등)들은 이 근거를 교육 실천 및 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ed et al., 2009; Van der Vleuten et al., 2000; Yardley et al., 2010).
이 논문에서는 evidence-informed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EIHP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PE에 참여하는 개인(예: 교수, 평가,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행정, 연구 등)이 교육 실천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Thomas et al., 2019)
이 글의 목적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knowledge translation (KT, 지식전이) 및 implementation science (IS, 실행과학)의 개념을 차용하여, 보건의료교육에서 EIHPE를 ‘진정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우리는 HPE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발적인 지식의 성장 속에서 이 지식이 실제 교육 실천과 정책에 어떻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KT 이론과 원칙 및 절차를 통합하고, EIHPE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요 행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론 중심, 단계적, 체계적인 접근법이 교육 연구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논문은 다음의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 EIHPE 운동의 동기에 대해 논의하며, 보건의료교육에서 과학적 근거 사용에 대한 역사적 논의 맥락에 위치시킨다.
- KT와 IS의 기원을 간단히 설명하고, 두 개념의 목표 차이를 구분한다.
- KT와 IS가 어떻게 EIHPE의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를 제안한다.
-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제안하며 결론을 맺는다.
또한, 하나의 HPE 실천 사례를 논문 전반에 걸쳐 삽입하여, KT와 IS 개념이 어떻게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건의료전문직 교육에서의 근거 기반(evidence-informed) 접근을 위한 요청
보건의료전문직 교육(Health Professions Education, HPE)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 등장한 것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Kuper et al., 2010), EIHPE 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점차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처럼 연구 기반의 교육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러 핵심 협회 및 전문 단체들로부터 나왔으며, 예를 들어 Institute of Medicine, Association of Medical Education of Europe,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등이 있다. 또한, Best Evidence in Medical Education (BEME) Collaboration, ask AMEE와 같은 이니셔티브들과 다수의 핵심 연구자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2001년 Institute of Medicine 보고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교육이
"변화하는 환자 인구통계와 요구, 보건 시스템의 기대 변화, 진료 요건과 인력 구성의 변화, 새로운 정보와 기술, 그리고 질 향상에 대한 집중"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on Quality of Health Care, 2001, p.1, chap. 2).
이어진 2003년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전문직 교육과정이
환자 중심 진료(patient-centered care), 학제간 팀(interdisciplinary teams), 근거 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정보학(informatics) 등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였다(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o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2003).
이러한 EIHPE로의 전환 노력은 여러 이니셔티브의 성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 BEME Collaboration: 교육 연구의 최신 결과를 종합(synthesis)하고 이를 널리 배포하여, 보건의료교육에서 근거 기반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적 협력체. 연구자, 대학, 전문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근거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Harden et al., 2000).
- ask AMEE: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자원으로, 특정 교육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교육자들이 실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여러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이 보건의료교육 연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글을 써왔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강조한다:
- 교육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에 맞춰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OECD, 2012; Dauphinee & Wood-Dauphinee, 2004)
- 이론과 실천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Durning et al., 2012; Tractenberg & Gordon, 2017)
특히, EIHPE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고유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문헌에 풍부하게 나타난다:
- (a) 교육 연구 결과의 맥락 특이성(context-specificity): 이는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환경 및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Onyura et al., 2015).
- (b) 활용 가능한 근거의 질과 강도(Cook & Beckman, 2010; Norman, 2007)
- (c) ‘현실 세계(real world)’에서 교육 연구의 관련성과 그에 따른 교육 환경에서의 실행 가능성(Cook & Beckman, 2010; Yardley, 2014; Maggio et al., 2018)
- (d) ‘근거(evidence)’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논쟁(Thistlethwaite et al., 2012; Yardley et al., 2010)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HPE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EIHPE를 향한 요구, 그리고 HPE 연구의 통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모두 보건의료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욱 근거에 기반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례 예시: KT 프로세스의 실제 적용
이 논문에서는 KT(knowledge translation) 과정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사용한다.
한 소규모 물리치료 프로그램(연간 신입생 약 50명)이 입학 절차(admissions procedures)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여 년 전 설립 이래로, 세 명의 면접관(교수 2인, 임상의 1인)이 지원자의 입학 서류(admission file)를 미리 열람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비맹검 단일 면접(single non-blind interview)을 시행해 왔다.
현재 프로그램 책임자와 입학위원장은, 다수의 심리측정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MMI(Multiple Mini Interviews)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입학위원장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MMI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 과정에 입학위원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한다.
지식전이(Knowledge Translation)와 실행과학(Implementation Science)의 기원
- 지식전이(Knowledge Translation, KT)는 여러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단계 프로세스로, 그 목적은 연구 근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존의 ‘연구-실천 간 간극’을 해소하며, 결과적으로 교육 실천 및 궁극적으로 환자 돌봄을 개선하는 데 있다(Straus et al., 2011; Graham et al., 2006).
- 한편, 실행과학(Implementation Science, IS)은 KT에서 사용되는 이론(theories), 모델(models), 방법론(methods)을 연구하고 정교화하는 분야로서, 보건의료전문직 교육(Health Professions Education, HPE)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auer et al., 2015).
아래에서는 이 두 개념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식전이(Knowledge Translation)와 그 단계
KT는 diffusion, research utilization, knowledge exchange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Thomas & Bussieres, 2016a,b), 전반적으로 KT는 효과적인 실천과 정책이 특정 맥락(context) 안에서 잘 채택되고(adoption), 적절히 조정(adaptation)되고, 안정적으로 전달(delivery)되며, 지속 가능하게 유지(sustainability)되도록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학문적 합의가 있다(Brown et al., 2017).
KT는 생의학(biomedical) 및 임상과학(clinical science) 분야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진단 도구 및 치료법이 많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과잉(overused), 과소(underused), 또는 오용(misused)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Schuster et al., 1998; McGlynn et al., 2003).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최적의 진료(suboptimal care)와 나쁜 건강 결과(poor health outcomes)로 이어졌다.
임상 현장에서 과학적 근거가 과소, 과잉 또는 오용되는 근본 원인에 대해 20년 넘게 축적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들이 단독 또는 상호작용하여 임상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개인적 요인(individual factors)의 예:
- 근거(evidence)에 대한 지식 부족
- 새로운 실천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부족
- 변화에 대한 저항
- 근거의 성격과 실제 사용 사이의 긴장(tension) (Gupta et al., 2017; Lizarondo et al., 2011; Duncombe, 2018)
- 맥락적 요인(work context)의 예:
- 최신 기술이나 사용자 친화적 도구에 대한 접근 제한
- 진료 시간에 대한 경쟁적 요구
- 리더십의 가치 체계
- 조직의 분위기 및 근거 기반 실천에 대한 부정적 또는 상충되는 태도(Gale, 2009; Bonham et al., 2014)
더욱이, 새로운 지식의 방대한 양과 그 생성 및 확산 속도는 KT의 적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실상, 임상의들이 최신 지식을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Corish, 2018).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KT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Sect. “How knowledge translation and implementation science can support evidence informed health professions education”에서 자세히 설명됨):
- 연구-실천 간 간극의 성격과 규모를 문서화한다.
- 연구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개인, 조직, 시스템 수준의 결정 요인(determinants)을 파악하고 설명한다.
- 이론 중심(theory-driven)이며 상황에 맞춘 맞춤 전략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Graham, 2012).
특히, KT가 연구-실천 간 간극을 성공적으로 메우기 위해서는 교수자, 교육과정 책임자 등 다양한 맥락의 핵심 이해관계자(key stakeholders)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Bowen & Graham, 2013). 하지만 KT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복잡성(complexity)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실천에 전이하고자 하는 근거의 성격, 강도, 관련성
- 새로운 실천(innovation or new practice) 자체의 특성
- 최종 사용자(end users)가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변화된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강화 및 지원(organizational reinforcement and support)
→ 이는 종종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에 대한 기존 조직의 강한 헌신과 충돌할 수 있다.
실행과학 (Implementation Science)
KT(Knowledge Translation)의 실무자와 연구자들은 건강전문직의 행동이나 새로운 실천에 대한 순응도(adherence), 그리고 실행 결과(implementation outcomes)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예: 사회학, 심리학), 이론(예: 학습 이론, 행동 변화 이론, 조직 이론), 그리고 프레임워크(예: KT 프로세스 모델, 결정 요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Brehaut & Eva, 2012; Colquhoun et al., 2010). 이러한 접근은 KT 과정에 수반되는 수많은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인간 행동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맥락(context)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실행과학(IS)의 주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과학적 지식의 교육 실천으로의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개입(intervention)은 반드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탄탄한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해당 맥락 안에서 EIHPE를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한다(Lapaige, 2010).
적절히 사용될 경우, 다양한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T를 강화할 수 있다(Nielsen et al., 2015a):
- 개념적 명확성 향상
- 개념 간의 가설적 관계 명시
- 변화 또는 연구 활용의 결정 요인 식별
-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고안
- 실행 과정 또는 결과 명확화
-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 제시 (Birken et al., 2017; Hull et al., 2019)
지식전이를 안내하는 모델과 프레임워크
KT를 안내하는 수많은 모델과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이전 연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Nilsen & Bernhardsson, 2019; Weiner et al., 2017; Birken et al., 2017, 2018).
간략하게 예를 들면, Nielsen et al. (2015a, b)은 세 가지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범주의 이론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 연구 결과를 실천으로 전이하기 위한 과정(process)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모델
→ 예:- Knowledge to Action(KTA) framework (Graham et al., 2006)
- Stetler model (Stetler, 2010)
- 실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
→ 다양한 이론과 프레임워크 활용:- 결정 요인 프레임워크(determinant frameworks):
- Theoretical Domains Framework (TDF) (Michie, 2014)
- 고전 이론(classical theories):
-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Godin et al., 2008)
-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 & Fishbein, 2000)
- 실행 이론(implementation theories):
- 실행 분위기(Implementation Climate) (Jacobs et al., 2014)
- 조직 준비도(Organizational Readiness) (Weiner, 2009)
- 결정 요인 프레임워크(determinant frameworks):
- 실행 결과를 평가(evaluate)하는 모델
→ 예:- PRECEDE-PROCEED model (Green & Kreuter, 2005)
- Proctor et al. framework (Proctor et al., 2011)
적절한 프레임워크 선택에 대한 고려사항
모든 상황에 적합한 ‘황금 기준(gold standard)’ 프레임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Birken et al., 2018; Nilsen & Bernhardsson, 2019; Weiner et al., 2017)은 프레임워크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적절한 모델 또는 프레임워크의 선택은 수행하려는 KT 목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실천의 통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할 경우, 결정 요인 프레임워크(determinant frameworks)가 적절하다. 우리의 경험상, 프레임워크 선택은 다음의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익숙함
- 사용의 용이성
- 해당 프레임워크가 KT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실행과학의 확장된 범위
중요한 점은, 실행과학(IS)의 범위는 전통적인 임상 연구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다. 전통적 임상 연구가 개별 환자 수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실행과학은 의료 제공자, 조직, 정책 수준까지 모두 고려한다.
Bauer et al. (2015)는 실행과학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행 연구(Implementation research)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조직 과학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일선 임상의, 환자 등 운영 파트너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연구팀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이다."
"Implementation research requires transdisciplinary research teams that include members who are not routinely part of most clinical trials, such as health services researchers, economists, sociologists, anthropologists, organizational scientists, and operational partners including administrators, front-line clinicians, and patients."
즉, 실행과학은 다학제적(transdisciplinary)이고, 정책-조직-개인 수준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식전이(KT)와 실행과학(IS)이 근거 기반 보건의료전문직 교육(EIHPE)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절에서는 근거를 실제 교육 실천에 전이하기 위한 지식전이(KT)의 세 단계 과정을 다룬다:
- 연구-실천 간 간극의 성격(nature)과 규모(magnitude)를 파악
- 연구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개인, 조직, 시스템 수준의 요인을 식별하고 설명
- 연구-실천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KT 개입 전략을 설계, 실행, 평가
각 단계마다, 실행과학(IS)이 KT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즉, 탄탄한 방법론과 프레임워크 사용), 앞서 제시한 물리치료 프로그램 입학 절차 개편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Table 1 참조).
1. 연구-실천 간 간극의 성격(nature)과 규모(magnitude) 파악하기
- 여기서 말하는 ‘성격(nature)’이란, 현재의 교육 또는 정책 실천(e.g. 사용되는 교수법, 특정 교육 개입의 노출 빈도, 평가 방식 등)이, 경험적 문헌(original research)이나 근거 종합(evidence synthesis, 예: BEME reviews), 또는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guidelines)(예: Twelve Tips, ask AMEE, AMEE guides)에 제시된 ‘최선의 실천(best practice)’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규모(magnitude)’란 현재 실천이 최선의 근거와 얼마나, 어느 정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얼마나 크고 널리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차트 감사(chart audits), 체크리스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재활의학(Anaby, 2017), 의학(Bryant et al., 2014), 간호학(Squires et al., 2011) 연구에서 임상 내 간극을 문서화하고 측정하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다.
▶ 사례 적용: 물리치료 입학 절차에서의 1단계
우리의 입학 사례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는 현재 물리치료 프로그램의 입학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입학 위원회(admissions committee)는 프로그램 및/또는 인증(accreditation) 문서를 검토하여, 현재 학생 선발 절차(selection practices)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이어서, 보건의료전문직 교육(HPE) 프로그램의 선발 및 입학과 관련된 기존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s)을 검토한다 (예: Patterson et al., 2016, 2017).
- 가능하다면, 특히 재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MMI(Multiple Mini Interviews)의 설계, 실행, 효과 평가에 대한 최선의 실천(best practices)을 목록화한다.
-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 중인 입학 방식(예: 한 개의 패널 면접)이 문헌에서 권장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 예: 문헌에서는 복수의 짧은 시나리오 기반 면접, 각 면접이 하나 이상의 역량을 평가, 면접관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예: 임상의, 일반 시민 등)가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비록 연구-실천 간 간극을 문서화하는 과정은 KT에서 반드시 필요한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가 아는 한, HPE 문헌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증거는 매우 드물다.
2. 연구 결과를 실천에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 시스템 수준의 요인을 식별하고 설명하기
연구-실천 간 간극(research-practice gap)이 식별되면, 그 원인(causes) 또는 결정 요인(determinants)을 규명해야 한다.
여기서 결정 요인(determinants)이란, 연구 근거가 교육적 의사결정에 활용되거나, 새로운 실천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촉진 요인), 낮추는(= 저해 요인)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 개인 수준(individual level):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s), 기술(skills)
- 조직 수준(organizational level): 자원의 가용성, 조직 문화, 변화 수용성(readiness to change)
- 시스템 수준(system level): 교육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 인증 기준 등
(Thomas & Bussieres, 2016a, b)
이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실행(intervention) 노력에서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보건의료전문직 교육(HPE)의 맥락에서 근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는 아직 드물다. 예를 들어, Onyura et al. (2015)는 의학교육자들이 연구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 촉진 요인(예: 교수 개발, 지식 창출에의 참여)과 저해 요인(예: 낮은 질의 근거, 시간 부족, 교수진의 변화 저항)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특성(environmental features)을 분석하였다. 또한, 약 400명의 AMEE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Thomas et al. (2019)는 EIHPE의 촉진 요인으로 다음을 확인하였다:
- 근거(evidence)라는 개념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근거 기반 교육자(evidence-informed educator)로서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
- HPE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능력(appraisal ability)
- 동료들이 근거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
반면, EIHPE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는 다음이 나타났다:
- 경쟁적인 직업적 우선순위(conflicting professional priorities)
- 방대한 HPE 문헌의 양
- 직장에서의 연구 접근성 부족
흥미롭게도, 이러한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은 직무(role)와 전문 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s)에 따라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Thomas et a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임상 연구에서는 KT 연구자들이 특정 실천에 대해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조사한다. 예: 특정 환자군에 대해 특정 평가도구나 치료 개입을 사용할 때, 어떤 요인이 그 실천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것. 응답자는 해당 실천을 기준점(anchor)으로 삼아 답변할 수 있다” (Thomas et al., 2019).
HPE 맥락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특정 집단의 실천가들, 특정한 맥락, 그리고 특정 교수 방법이나 평가 실천에 대해, 연구-실천 간 간극을 식별하고 이에 기반해 분석해야 한다.
▶ 사례 적용: 물리치료 입학 절차에서의 2단계
이 단계에서 입학 위원회(admissions committee)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 교수진, 재학생(현 물리치료 전공자), 임상의, 실습 지도자(preceptors)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포커스 그룹, 간단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새로운 면접 방식(MMI) 도입에 대한 인식된 도전 과제(perceived challenges)를 탐색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촉진 요인(facilitators)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수의 동기(motivation)
- 협력적인 동료(colleagues)
- 문헌 검토 및 면접 문항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release time)
- 이미 MMI를 시행한 타 HPE 프로그램의 지원
저해 요인(barriers)으로는 다음이 있을 수 있다:
- HPE에서 해당 입학 절차의 가치와 근거에 대한 교수 및 관리자들의 지식 부족
- 소규모 프로그램 특성상, MMI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자원 부족
- 교수진이 자신의 일정 안에서 MMI를 통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
▶ 실행과학(IS)의 원칙에 따른 접근
실행과학의 관점에서, 촉진 및 저해 요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충분히 탄탄(robust)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학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결정 요인 프레임워크(determinant frameworks)를 사용할 수 있다:
- Theoretical Domains Framework (TDF) (Cane et al., 2012)
- Consolidated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Research (CFIR) (Damschroder et al., 2009)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이행 과정의 이 단계를 구조화하고 안내하는 데 유용하다.
3. 지식전이(KT) 개입 전략의 설계, 실행, 평가
KT 개입 전략의 대상 집단(target audience)과 목표(goal)가 명확해지고, 변화에 대한 저해 요인(barriers to change)이 파악되면,
이제는 개입(intervention)의 핵심 요소들(active elements)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입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설계 과정을 안내할 수 있는 이론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 기존 실천에 대한 신념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 변화
-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변화
- 목표 설정(goal-setting) (Brehaut et al., 2016)
이러한 개입 설계는 대개 합의(consensus)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KT 개입을, 앞서 식별된 저해 요인(=결정 요인, determinant)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Atkins et al., 2017).
KT 개입은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 구조를 갖는다. 이들 요소는 종종 비선형적(non-linear)으로 작동한다. KT 개입의 전달 방식(mode of delivery)에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이고 물류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Bragge et al., 2017):
- 전달 수단(mode): 예: 영상(video), AMEE 가이드
- 적용 수준(level): 예: 학생, 전문직 간 팀, 프로그램 단위
- 강도와 빈도(intensity and frequency)
- 전달자(deliverer)는 누구인가?
- 대상 집단의 규모(size of the target group)
현재 HPE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이 개입이 효과가 있는가?”를 넘어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제공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실천 중심의 질문으로 전환되고 있다(Wong et al., 2012). 이에 따라, KT 개입의 견고한 평가(robust evaluation)는 매우 중요하다 (Davies et al., 2010; Moore et al., 2015).
▶ 이론 기반 KT 개입 설계: AIMD 프레임워크
지난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론 기반(theory-based)이고, 맥락에 맞춘 맞춤형 KT 개입을 설계하는 방대한 문헌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를 교육 실천, 시스템, 정책에 통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로, AIMD 프레임워크는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개발된 실행 프레임워크(implementation framework)로서, KT 개입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Bragge et al., 2017). AIMD는 다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 구성 요소 | 설명 |
| Aims (목표) | 이 개입을 통해 무엇을, 누구를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가? |
| Ingredients (구성 요소) | 개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 Mechanisms (작동 원리) | 이 개입은 어떻게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가? |
| Delivery (전달 방식) | 이 개입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이 프레임워크는 개입의 기획과 실행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돕는다.
▶ AIM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입학 절차 개선 사례의 KT 개입
AIMD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입학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KT 개입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Aims (목표)
이 개입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진다:
- 지식 결핍이라는 장벽을 해소하고,
- 교수들의 일정 상 시간 소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MMI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것이다.
2. Ingredients (구성 요소)
이 개입은 앞서 식별된 세 가지 주요 장벽을 각각 공략하는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 (a) 교수들에게 MMI의 근거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고,
면접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한다. - (b) 다른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MMI를 도입한 동료 교수들(= 챔피언)의 증언(testimonials)을 통해,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한다. - (c) MMI 영상 또는 웨비나(webinar)를 제공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Q&A)을 통해 실시간 소통을 가능케 한다. - (d) 모의 MMI(simulated MMI) 세션을 진행하여,
면접 평가자들이 실제 면접 스테이션을 채점해보고, 물리적·운영상의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원의 제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매우 실질적인 장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 해법(silver bullet)’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도입 첫 해에는 스테이션 수를 줄여 MMI를 시작하고, 실행이 안정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다.
KT 개입의 과정(process) 및 결과(outcome)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에는 MMI 스테이션의 수와 유형이 다양화될 수 있다. 또한, 문헌에서 제시된 ‘최선의 실천(best practice)’이 그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경우, 그 근거를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adaptation)’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3. Mechanisms (작동 원리)
해당 프로그램의 지역적 필요(local needs)를 고려할 때, 제안된 개입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론이나 실증적 근거에 기반할 수 있다”(Bragge et al., 2017).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과 웨비나는 지식 격차 및 자신감 결핍을 해소하도록 설계되며, 새로운 지식은 교수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실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Bragge et al. (2017)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용어는 ‘어떻게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는가’(empirically established) 또는 ‘어떻게 작동한다고 이론적으로 추론되는가’(theoretical rationale)를 의미할 수 있다”(p.7).
또한, 챔피언(champion),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또는 전문가(expert)의 활용은 교수들이 MMI 절차를 자신의 일정 안에 통합할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Delivery (전달 방식)
이러한 개입을 전달하는 방식은 현지 맥락(local context)에 부합하면서, 실현 가능하고(feasible), 수용 가능하며(acceptable) 효과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 대면 회의(face-to-face meetings)
- 온라인 포럼(online fora)
- 다른 프로그램 또는 타 대학의 MMI 전문가들과의 자문(consultation)
이러한 전달 방식은 자원 및 일정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행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된다.
앞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과 연구 과제 (Areas for future consideration and research)
우리는 이 논문을 마무리하며, 지식전이(KT)와 실행과학(IS)을 활용하여 근거 기반 보건의료전문직 교육(EIHPE)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래 보건의료 전문가 교육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는 원칙을 되새기며, HPE 공동체 전체가 이를 교육 실천 개발, 실행, 평가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동료 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HPE를 개선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lbert et al. (2007)이 설명했듯이, 의학교육(HPE) 연구는 ‘지식 생성(knowledge production)’과 ‘지식 활용(knowledge use)’이라는 두 축 사이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연구자로서 제기하는 질문과 그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관계없이, 우리는 의학교육 학문 활동(HPE scholarship activities)을 이 연속선상(continuum) 어디쯤에 위치시키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어느 축에 더 가까이 있든, 혹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유동적이든, 이 연속선에서의 위치는 EIHPE 의제에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지식을 누가 생산하는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생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
HPE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high-stakes) 영역의 변화하는 연구 의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역량 기반 의학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
- 평가(assessment)
- 학생 선발 및 입학(selection and admissions)
-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 플립 러닝(flipped classroom)
- 다양성과 사회적 책무성(diversity and social accountability)에 대한 관심 증가
앞으로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지지하는 교육적 “트렌드”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지속될 것이다.
▶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의 필요성
EIHPE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교육 결정의 논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교육 실천 및 정책 수립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책무성과 학문적 사명(academic mission)이 진화하는 이 시대에, 고립된 전문가 중심 접근(silos and ivory towers)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의 교육 의사결정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언제, 왜 참여해야 하는가?”
▶ 교수 개발(Faculty Development)과 KT 개입
교수 개발(faculty development)은 KT 개입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왔다(Thomas & Steinert, 2014). 비록 현재까지는 교수 개발이 KT 개입의 한 형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이 주제가 경험적 탐색(empirical examination)에 충분히 값어치 있는 연구 주제라고 제안한다. 임상 현장에서 KT 개입으로 정의된 활동들과 HPE 내 교수 개발 활동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과 중첩 영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수 개발은 교수자들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에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teaching)
- 연구(research)
- 리더십 실천(leadership practices)
-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 유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EIHPE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수 개발은 단순한 기술 향상을 넘어, 교육 실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할 수 있다.”
(McLean et al., 2008; Steinert, 2000, 2011; Steinert et al., 2006, 2012)
이상으로, 본 논문은 HPE에서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는 전략적 방법으로 KT와 IS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의학교육(EIHPE)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한다.
다른 과학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EIHPE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한 학술 활동(scholarship)이 필수적이다.
최선의 실천(best practices)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적절하게 조정(adapt)하기 위한 견고한 방법론(robust methodologies)이 요구되며, 임상 과학 분야에서의 KT 연구들은 이러한 EIHPE 방법론 개발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두 주제는 향후 EIHPE 의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a) 교육 및 실천의 맥락은 특정 기관의 사명(mission), 가용 자원(resources), 그리고 성과(outcomes)에 뿌리를 둔 정책과 절차(policy and procedures)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
- (b) 이러한 조직적 사명과 자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근거(evidence)가 실제로 교육 의사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결론 (Conclusions)
이 논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IHP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HPE) 공동체가 의도적이고 신중하며 체계적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 전반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 KT의 실천과 KT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실행과학(IS)이
→ HPE의 근거 기반 접근(evidence-informed approach)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간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학습과 전문성 개발이 복잡한 HPE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KT 전략의 방향을 제안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습 맥락 안에서 이질적인 학습자와 교육자 집단을 고려하여 KT 노력이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획일적인(one-size-fits-all) KT 접근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처방적 규범을 제안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바람은 이 논문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 HPE 공동체 내부의 추가 논의를 자극하며,
-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실천하는 교육 방법과 정책이 최고의 근거(best available evidence)에 부합하고,
- 사회적 요구(societal needs)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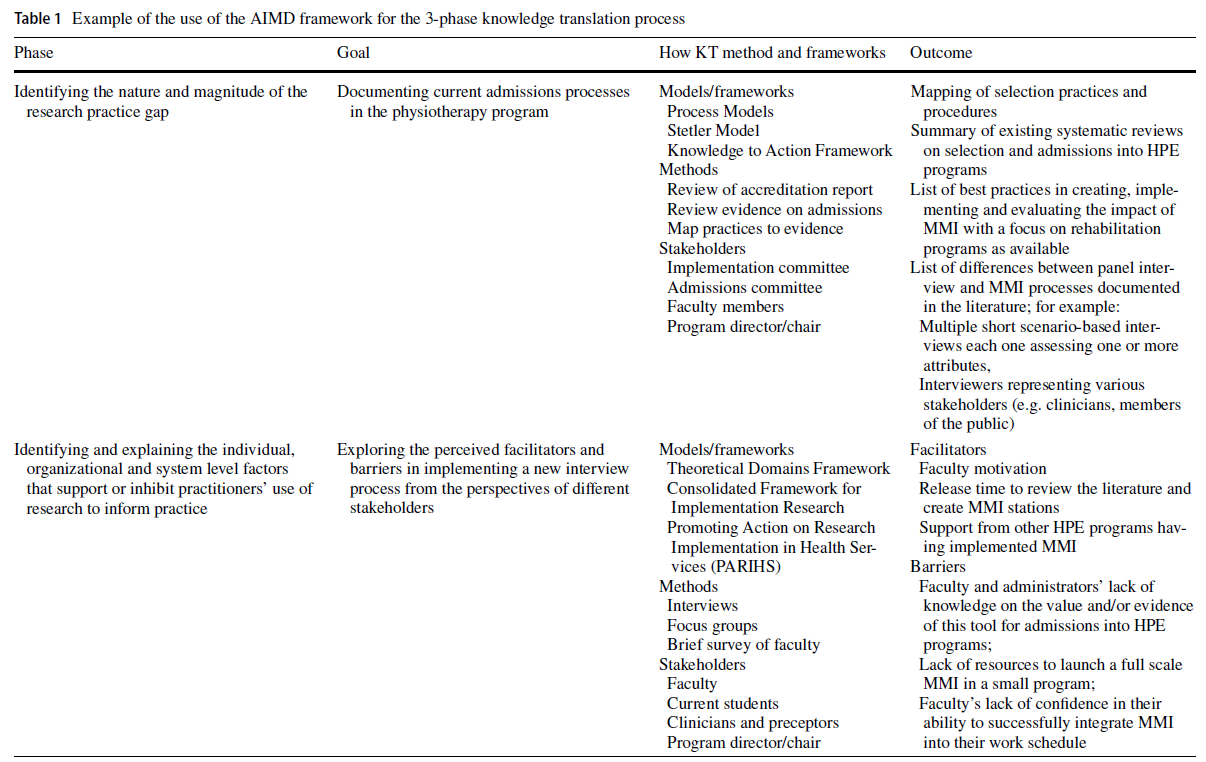
1단계: 연구-실천 간 간극의 성격과 규모를 식별하기
목표: 물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학 절차(admissions processes)를 문서화한다.
활용 방법 및 프레임워크:
- 모델/프레임워크:
- Process Models
- Stetler Model
- Knowledge to Action (KTA) Framework
- 방법(methods):
- 인증(accreditation) 보고서 검토
- 입학과 선발에 관한 근거 검토
- 실제 실천을 근거에 매핑(mapping)
- 주요 참여자(stakeholders):
- 실행 위원회
- 입학 위원회
- 교수진
- 프로그램 디렉터 또는 책임자
기대 결과(outcome):
- 선발 실천 및 절차의 체계적 정리(mapping)
- HPE 프로그램의 선발 및 입학에 관한 기존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요약
- 특히 재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MMI의 설계, 실행, 평가에 관한 최선의 실천 목록
- 문헌에서 기술된 패널 면접과 MMI 방식 간의 차이점 목록. 예:
- 다수의 짧은 시나리오 기반 면접이 각기 하나 이상의 속성을 평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예: 임상의, 일반 시민 등)가 면접관으로 참여
2단계: 연구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 시스템 수준 요인을 식별하고 설명하기
목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면접 방식(MMI)을 구현하는 데 있어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탐색한다.
활용 방법 및 프레임워크:
- 모델/프레임워크:
- Theoretical Domains Framework (TDF)
- Consolidated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Research (CFIR)
- Promoting Action on Research Implementation in Health Services (PARIHS)
- 방법(methods):
- 교수진 대상 인터뷰
- 포커스 그룹
- 간단한 설문조사
- 주요 참여자(stakeholders):
- 교수진
- 현재 재학 중인 학생
- 임상의 및 실습 지도자(preceptors)
- 프로그램 디렉터 또는 책임자
기대 결과(outcome):
- 촉진 요인(Facilitators):
- 교수진의 동기 부여
- 문헌 검토 및 MMI 문항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
- 이미 MMI를 시행한 타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 저해 요인(Barriers):
- 교수 및 행정가의 HPE 맥락에서 이 도구(MMI)의 가치 및 근거에 대한 지식 부족
- 소규모 프로그램에서 전체 MMI를 운영할 자원 부족
- 교수진이 자신의 일정 안에 MMI를 통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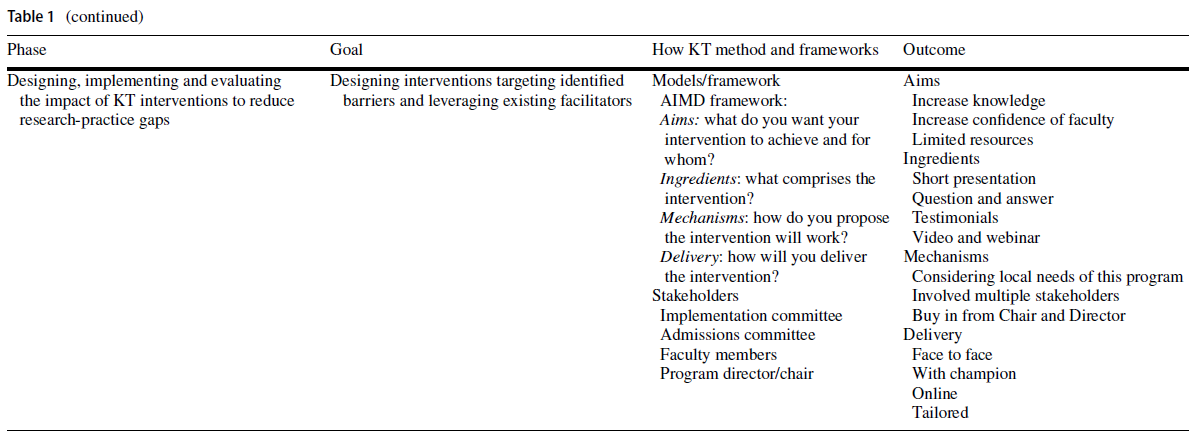
3단계: KT 개입이 연구-실천 간 간극을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설계, 실행, 평가하기
(Desig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impact of KT interventions to reduce research-practice gaps)
● 목표(Goal)
식별된 저해 요인을 타겟(target)으로 하고, 기존의 촉진 요인을 활용하는 KT 개입 전략을 설계한다.
● 활용 방법 및 프레임워크(How KT method and frameworks)
- 모델/프레임워크:
- AIMD 프레임워크(AIMD framework)
- Aims: 이 개입을 통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가?
- Ingredients: 이 개입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 Mechanisms: 이 개입은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Delivery: 이 개입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 AIMD 프레임워크(AIMD framework)
-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 실행 위원회 (Implementation committee)
- 입학 위원회 (Admissions committee)
- 교수진 (Faculty members)
-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디렉터 (Program director/chair)
● 기대 결과(Outcome)
✅ Aims (목표 관련 결과):
- 교수진의 지식 향상
- 교수진의 자신감 증가
- 자원 부족에 대한 현실적 고려
✅ Ingredients (구성 요소):
-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 질의응답(Q&A) 시간
- 타 프로그램 교수의 사례 발표(Testimonials)
- 비디오 및 웨비나(video and webinar)
✅ Mechanisms (작동 방식):
- 프로그램의 지역적 필요(local needs)를 고려
-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
- 디렉터 및 위원장의 지지(buy-in) 확보
✅ Delivery (전달 방식):
- 대면 회의(face to face)
- 챔피언(champion)을 통한 설득과 지지
- 온라인 환경에서의 제공(online)
- 맥락에 맞춘 맞춤형 설계(tailored)
이로써 AIMD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3단계 지식전이(KT)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발표자료용 슬라이드, 정책 제안 보고서, 블로그 포스트 등으로 재구성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논문 읽기 (with A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설절 추론 주제분석 가이드 (The Qualitative Report, 2022) (1) | 2025.05.23 |
|---|---|
| 질적 연구에서의 가설적 추론(Abductive) 분석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24) (0) | 2025.05.23 |
| 의료 전문직 교육 및 실무에서 지식과 실천 사이의 단절 (Adv Health Sci Educ Theory Pract. 2020) (0) | 2025.05.17 |
| 보건 전문직 교육을 위한 실행 과학에 대한 재고: 변화를 위한 선언문 (Perspect Med Educ. 2021) (0) | 2025.05.17 |
| 지식에서 행동으로 전환하는 주기: 격차 파악하기 (CMAJ. 2010) (0) | 2025.05.17 |